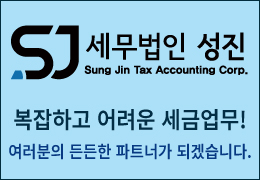임신빈(任信彬)
세무사
세무사
상속이라는 제도는 사유재산제도와 함께 태어난 산물이라 하겠다. 또 상속의 의미는 일정한 친족적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사이에서 그 한 쪽이 사망하거나 일정한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했을 때에 재산적 권리의무의 일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속재산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친족의 범위를 남녀가 동일하게 조정^개정되기 이전에는 여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다. 즉, 남편이 사망하자 재산권이 딸만 낳았다는 이유로 부계혈족만 따져 시동생에게 전부 이전되었던 경우도 있었다.
심한 경우에는 모녀가 돈 한푼 못받고 시댁으로부터 쫓겨나야 하는 억울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성평등의 원칙하에 민법이 개정되어진 것으로 추리되어진다.
민법 제767조에서 친족의 정의를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이라 규정지었고 민법 제777조에서도 친족의 범위를 8촌이내의 부계혈족과 동등하게 모계혈족도 8촌이내로, 배우자, 4촌이내의 인척으로 정해진 것을 보면 남녀의 평등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남녀의 경우 전과 달리 처의 형제자매, 처삼촌, 처사촌, 처사촌 동서까지도 친족으로 가족관계가 바뀌었다.
재산관계는 주로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 사이의 재산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가족 재산법으로 특히 상속법은 재산권의 승계를 규율하는 점에서 사유재산제도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상속의 근거가 ①혈연대가설 ②의사추정설 ③인격가치승계설 ④가족보호설 ⑤종적공동체설 ⑥생활보장설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상속제도를 설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활보장설로 자기책임하에 가족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망한 가족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생존가족 전원을 위해서 제사상속까지를 포함해서 이뤄져야 가장 자연스러우며 합목적적이라 하겠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보자. 金은 아들 3명이 있으며 부인 李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田씨와 재혼을 했다. 田씨는 金의 재산 전부를 田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놓았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金씨는 사망했다. 즉 金씨의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선산전답이 모두 田씨의 소유가 된 것이다. 田씨는 자녀출산이 없다. 田씨의 부모도 생존해 있지 않다. 혈족으로는 죽은 언니의 아들 朴씨가 있을 뿐이다. 현재 金씨의 아들들로부터 부모대접을 받고 있는 田씨가 사망하게 되면 田씨의 재산은 누가 상속을 받아야 하나.
혈족주의를 중시하는 우리 나라 민법으로 따지면 제1순위 상속자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없다. 제2순위인 직계존속, 배우자도 없다. 제3순위인 형제자매도 없다. 제4순위에 해당되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언니의 아들 朴씨가 언니의 대습상속인으로 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나라 민법이다. 다시 말해서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金씨 집안의 선산이며 전답이 엉뚱하게도 金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朴씨에게로 상속되는 것을 옳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田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만든 고의든 자의든 金씨의 잘못을 탓하기만 해야 되나.
전번 신문지상에 보도됐던 KAL기 추락사고로 인해 A가족이 모두 사망하게 되자 B사위에게 상속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B는 상속을 받을 때만 사위가 된다. C와 재혼할 것이며 그후 A의 집안과는 아무런 가족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지금에 와서 민법을 '90년이전 법으로 되돌려 놓자는 논리도 아니고 양성평등의 원칙이 잘못되기만 했다는 것은 아니다. 田씨의 소생이 없을 경우 언니의 아들한테 상속하게 되는 것보다 金씨의 아들들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자는 의견과, A와 친족관계가 끊어지는 B에게만 상속하지 말고 A의 형제자매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개인의 의견을 제시해 본다.
즉, 앞으로 상속제도와 민법의 개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원래의 상속의 의미나 상속제도의 근거취지에 부합되도록 세심한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