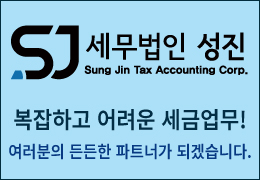정부가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화에 나선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부과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서민증세라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앞서 정부가 24일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개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세입자들의 상가 권리금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할 것임을 밝혔다.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권리금 표준계약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토록 하는 것 또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계약서를 통해 권리금이 노출될 경우 고스란히 세원으로 포착되는 효과가 파생된다는 점이다.
상가세입자 입장에선 권리금을 보호받게 된데 비해, 영업기간 동안 쌓아 온 무형자산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셈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상가권리금 법제화가 되면 전국적으로 약 120만 상인들이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표준계약서 작성 대상자 120만명의 권리금에 대해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추산한 상가권리금 평균 금액은 약 2천748만원으로, 전국적으로는 약 33조원 규모에 달한다.
2년 연속 세수가 펑크 난 정부입장에선 33조원대의 신규세원이 발굴되는 것으로, 이번 자영업자 대책에선 쉬쉬하나 도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가권리금 과세가 실현될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권리금의 법으로 규정될 경우 세금도 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향후 세금을 매길지는 과세당국의 방침에 달려 있다”고 과세가능성을 열어뒀다.
과세당국의 입장은 보다 명확하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경우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속함에 따라 원론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국세청 관계자 또한 “(과세)여력이 없었을 뿐 신고대상이자 과세대상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신규세원 발굴에 목매는 정부입장에선 상가권리금이 법제화되면, 권리금에 대한 과세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한편, 세무대리업계에 따르면, 상가권리금 과세가 현실화 될 경우 기타소득인 권리금 액수에 따라 세율 구간 또한 차등화된다.
권리금이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실질세율 4%가 적용되나, 이를 넘어설 경우 종합소득 합산규정에 따라 최대 38%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