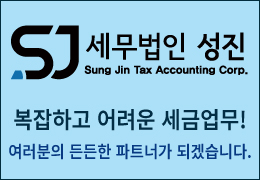우리나라가 1000억원 가량 수출했을 때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6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우기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팀장이 10일 발표한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벨류 체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종재 수출로 인한 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09년 기준으로 58.7%였다.
이는 1000억달러 가량의 수출품을 팔아봐야 국내에 떨어지는 돈이 587억달러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국제산업연관표(WIOD) 작성 40개국(61.7%)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0.4%) 평균보다 낮다.
이 팀장은 "광산품 등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다 기계, 전기전자 등 부가가치율이 낮은 조립가공제품 위주의 수출구조 탓"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 기준 중국 무역수지 흑자액은 2009년 64억 달러로, 총액기준(394억 달러)의 16.2% 수준에 불과했다. 중국에 1000억원을 수출할 때 실제 벌어들인 금액이 162억원 밖에 안되는 것이다.
반면 유럽연합(EU, 61억 달러→71억 달러)과 미국(-30억 달러→30억 달러)은 총액기준보다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수지 규모가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액의 36.0%가 EU와 미국의 수요로 발생한 것이어서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중국 비중이 축소되고 선진국 의존도가 커진 것이다.
국내 부가가치 중에서 소비· 투자 등 국내 수요에 의해 발생한 부가가치는 69.9%를 차지했다. 나머지 30.1%는 해외 수요가 일으켰다.
해외 수요는 중국이 6.1%였고, EU와 미국은 각각 5.3%, 3.8%였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의 해외 의존도는 30.1%로, 미국(8.4%)과 일본(10.9%), 중국(28.1%)보다 높았다.
이 팀장은 "수출의 국내 파급 효과를 높이려면 수출품을 다변화하고 국산 소재 부품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