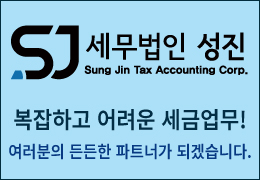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균형'을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전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연금의 보험료(불입액)와 연금수령액의 규모를 어떻게 정하는냐가 향후 연금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두 연금이 각각 직급, 근속연수, 연봉 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단순비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두 연금간 의미있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공무원연금은 퇴직 직전 3년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그리고 반드시 20년 이상 근무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했다면 월평균 15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된다. 소득수준 대비 연금 수준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20년 근무시 월평균 임금의 50%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후 소득대체율은 해마다 2%씩 올라 30년을 근무할 경우 70%가 돼 매달 21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 물론 월급여액이 같은 300만원이라 하더라도 직급 등에 따라 연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국민연금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금이 천차만별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본인의 전체 연금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연금액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역시 월평균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20년을 근무했다면 연금액은 80∼90만원 정도가 된다. 30년 근속자는 120만원 내외다.
이를 비교하면 근속기간이 같을 때 평균적으로 공무원들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매달 불입하는 보험료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월소득의 17%를 보험료로 내야 하며, 공무원 본인과 국가가 각각 8.5%씩 부담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근로자 본인과 회사측이 각각 월소득의 4.5%씩 모두 9%를 불입한다.
연금액과는 반대로 불입액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편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려면 공무원연금 불입액을 현 17%에서 12%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다만 공무원은 외형상으로는 퇴직금이 없지만 `퇴직수당'이 있다는 점을 빼놓아선 안된다. 퇴직수당은 전액 국가가 불입하는데 일반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에 비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평균임금과 두 연금간 체계가 크게 다르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두 연금을 단순비교해 개혁의 잣대로 삼는게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연금개혁 카드를 꺼내들고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점도 이같은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