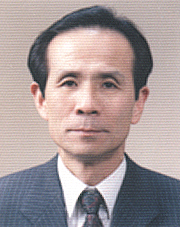
지난 연말에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부과제척기간이 없는 세금이 또 하나 생겨났다고 한다. 즉 예금 등 금융자산이 타인의 명의, 이른바 차명계좌에 보유돼 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감에 따라 명의자의 것으로 볼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 또는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척기간의 예외규정이다.
賦課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賦(돈)라는 것을 부담지운다’는 뜻으로 課한다고 하여 생겨난 말이다. 현대사회에서의 국민에 대한 부과의 대표적인 예는 조세이다. 조세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부과 징수하는 국민의 급부의무이다. 국민에게 강제로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과권의 행사에 관해 일정한 기간적 제한을 둬 법적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안전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제척기간 또는 시효라는 제도가 마련됐다. 시효제도는 주로 민사법에서 활용되고 제척기간은 행정관계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다.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해 일정한 권리에 관해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공통점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고, 제척기간은 소멸시효기간과 비슷하지만 시효에 적용되는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고정기간이라는 점과 당사자의 원용(援用)이 없어도 당연히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다르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의 소멸에 관한 기간적 효력을 규정하면서 부과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척기간(26조의2)으로 규정하고 징수권의 소멸에 과하여는 소멸시효기간(27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러한 구별의 실익은 어디에 있는가? 제척기간 또는 시효제도는 권리의 존부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떠나서 ‘권리를 베고 잠을 자는 사람은 그 권리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법언(法諺)이 입법취지를 말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권리의 존부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러한 상태로 그 사회는 안전성을 갖게 되므로 이를 다시 들춰낸다면 오히려 사회는 새로운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치 더러운 물건을 땅속에 묻어버려서 지상이 깨끗해졌는데 그 더러운 것이 묻혔다는 이유로 이것을 파낸다면 지상은 다시 더러워지기 때문에 계속 묻어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권리의 실체를 찾아내려는 측면과 사회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측면에서의 두가지 현상 가운데 사회의 안정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제도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형사에 있어서도 공소시효를 두고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15년이 경과하면 공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각 세목에 따라서 구분했다. 최근에는 특히 상속세·증여세에 관해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제척기간을 점점 연장해 왔다. 대부분의 제척기간은 납세자의 의무이행기간, 예를 들면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도래되는데 상속세·증여세에 대하여는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의 안 날이란 과세관청이 알게 된 날을 말하는 것인데 가령 과세사실이 있었음을 30년후에 알게 되면 그 때부터 1년내에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제척기간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논지이다. 그렇다면 30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못했거나 아니한 과실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인가?,
이 규정의 머리에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라는 한계를 두고 있으나 제척기간제도는 원인행위의 적법성이나 진실성을 따지지 아니하고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민사법의 지도원리에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부과제척기간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려면 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한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게 해야만 납세자에게 무제한의 납세의무기간을 부여한 데 대한 형평성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대사회의 1년은 과거의 10년과 맞먹는 변화의 속도를 나타낸다고 한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어서 상여가 나가는 것을 보고 사망사실을 포착해 상속세를 과세했다고 한다. 그때에 비하면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와 컴퓨터와 같은 기계의 발달로 과세정보의 포착이 훨씬 정밀하고 편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만을 연장하는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속도와 발전 현상에 반비례하는 것이며 사회적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본면의 외부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