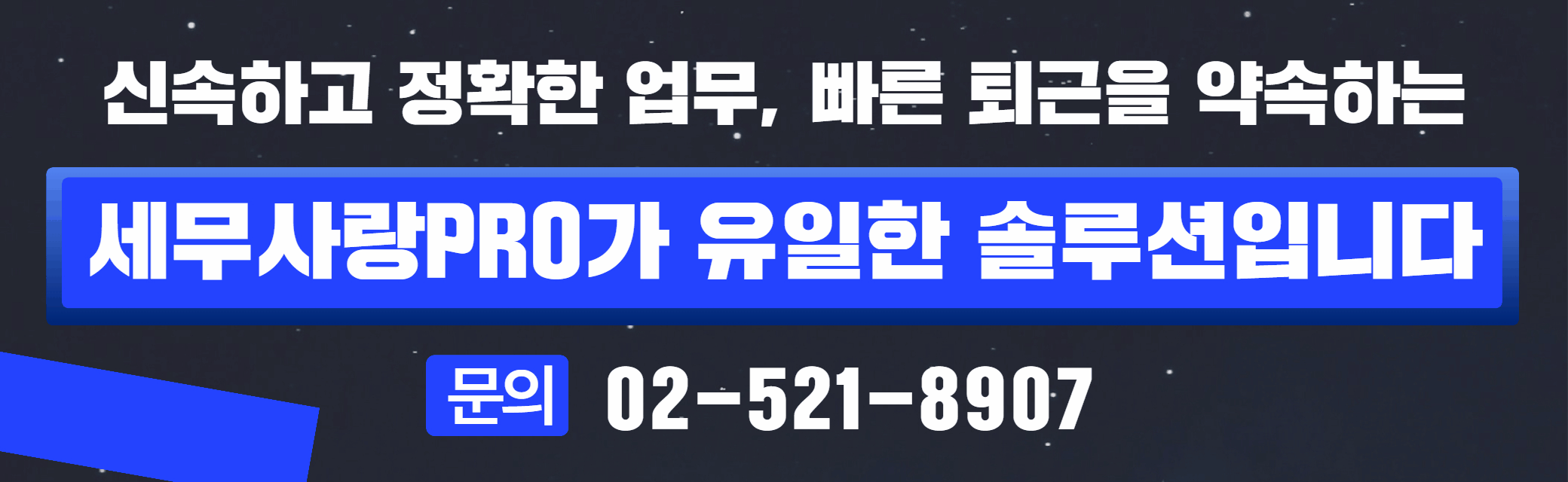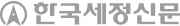장재철(張在鐵) 시인
本紙 論說委員
本紙 論說委員
몇 만원 住民稅라는 것만 안 내면 나는 영락없는 純無稅金族(?)인데……. 이쯤되면 理論上 國民된 資格이 甚히 결여된 셈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나가라-', `들어가란 말 없이' 살고 있으니 천만다행이랄밖에, 어디 대고 꾸벅 절이라도 하고픈 심정이다.
그러니 친절하고 충실한 공무원을 보면 원급으로 주는 돈(세금)을 못 대주는 내 처지에서는 뭔가를 거저 얻어먹을 때와 같은 미안감을 가눌 수가 없다.
그런데 몇 달전 서울에서 오는 친구를 마중하러 공항에 나갔을 때의 일이다. 손님의 휴대품 검사를 하는데 아주 난폭하고 불친절한 ××관 한 사람이 있었다.
눈을 부릅뜨고 필요이상으로 위엄을 부리는가 하면 여객의 귀중한 짐 보따리를 발길로 차 넘기는 듯하는 꼴이 여간 거슬리지가 않았다.
“그 사람 꽤 까다롭군……. 그러나 저 일은 저런 깐깐한(?) 사람이 아니고는 어려울지도 모르지.”
내가 이렇게 善意로만 접어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그의 태도와 행동거지에 一大異變이 생겼다. 그렇게 사납기만 하던 눈길이 보살님처럼 순해지더니 하던 일을 곁에 동료에게 떠맡기고 허둥지둥 여객대합실로 달려 나갔다. 그리고 한 손님에게 90度 角度의 최고 예의를 갖추고 나서 그 손님을 마치 옛날 임금님 모시듯 부액(곁 부축)까지 해서 비행기안에 모셔다 드리고 있지를 않는가. 그 손님은 곁 부축을 해야 할 만큼 늙은 나이도 아닌데……. 그 손님이 혹시 그의 직속상관이나 집안 어른이었단 말인가? 천만에 그게 아니었다. 이 지방의 이름난 財閥이었다.
`그렇다면 남보다 많이 내는 稅金에 대한 禮遇였다는 말인가?' 나는 굳이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면서 나도 앞으로 稅金 많이 내는 떳떳한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고 털끝만큼의 保障도 없는 꿈같은 다짐을 하면서 가을 하늘 맑은 창공을 쳐다보고 소처럼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