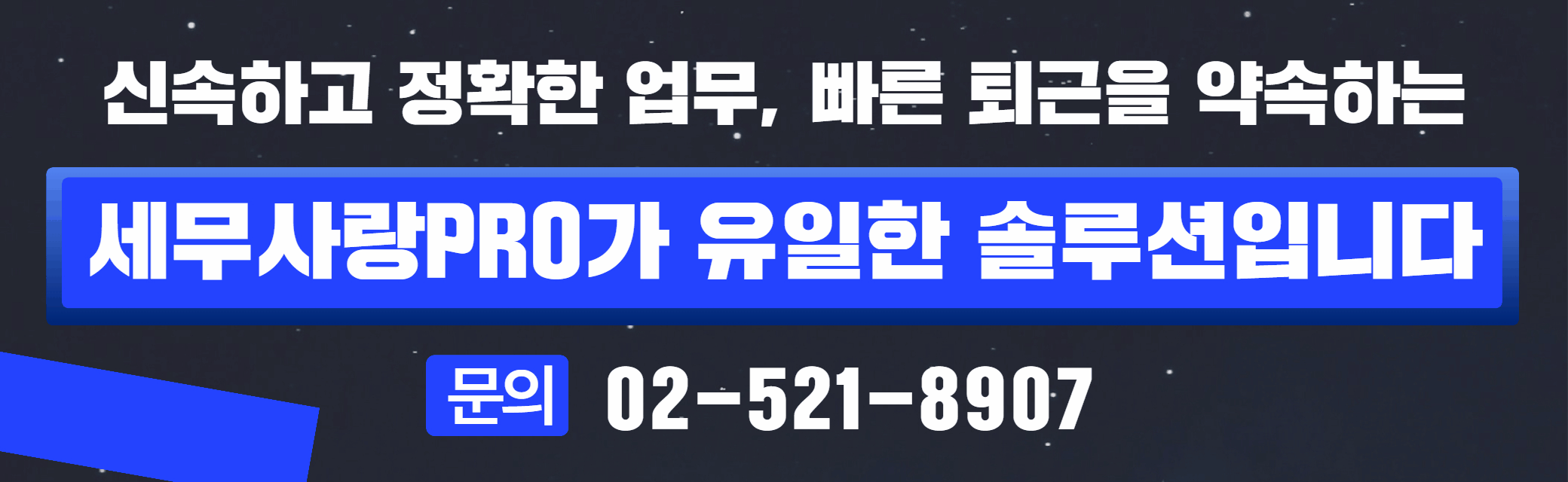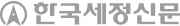제19대 국회의원 총선이 지난 지가 한달 가까이 되어 간다.
총선이 지난 지 한참 됐는데 무슨 후보·당선자들의 납세실적을 논하느냐고 하겠지만 선거 전후 모임에 가서 19대 총선 후보들의 납세실적과 당선자들의 한심한 납세실적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후보로 등록했고, 또 당선됐으니 우리 국민들도 그러한 한심한 납세실적을 가진 후보들을 당선시켰으니 자성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후보들을 당선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니 그런 이야기를 이 모임에서만 하지 말고 글로서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기에 이 글을 쓰게 됐다.
실은 필자는 16대 총선 때부터 후보자들 중 많은 후보들의 형편없는 납세실적을 분석해 지상을 통해 공개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그들의 납세실적은 부끄러울 정도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크게 첫째 입법에 관한 일 둘째 재정에 관한 일 셋째 일반 국정에 관한 일이다.
이중 두번째 재정에 관한 일은 예산안 심의 확정, 즉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정부에 이송하는 일과, 결산심사로서 한해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 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입법 즉,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류와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한계 등을 법률로써 규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은 공평하게 세금을 받도록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배분해 그 배분액이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위이다.
이렇게 세금과 깊이 연관된 공직을 맡아 공무를 수행하겠다는 사람들이 본인은 5년동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거나 소액만 냈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직선거법을 2000년2월16일 개정해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등록하려면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원 후보는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실적이 좋은 후보자들이 입후보하기를, 또 그러한 후보들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16대 총선 때부터 이러한 글을 쓰고 있으나 이번에도 크게 좋아지지 않아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902명의 최종후보들이 지난 5년간 낸 세금(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이 지난해 1년간 국민 1인당 세부담(501만원)에도 못 미치는 후보가 245명에 달하고 이중 23명은 아예 한푼도 내지 않았고, 50만원 미만 납부자 51명, 100만원 미만 납부자도 34명에 달한다. 또한 5년 동안 체납한 적이 있는 후보도 104명이나 됐다. 금고 이상의 범죄 전과 경력자도 186명이나 된다. 100만원 미만 납세자는 여야를 불문하고 다 있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51명 후보자 중 한푼도 안 낸 후보가 3명, 50만원 미만 납부한 후보가 13명, 100만원 미만 납부한 후보가 5명으로 무려 21명이 5년간 100만원 미만 납세실적으로 입후보했고, 이중 4명이 당선됐다. 그 중 한 명은 납세실적이 0인 당선자이다.
평균연령이 40∼50대인 후보들이 아내와 자식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5년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거나 소액의 세금만 납부했다면 그들은 필자가 모르는 고도(?)의 절세방안을 갖고 있거나, 탈세를 했거나 아니면 무위도식하며 남의 신세만 지며 그 나이까지 살았거나 정당판을 어슬렁거리는 '정치 룸펜'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그들이 후보기탁금 1,500만원은 어떻게 냈는지 신기하다. 자신들이 세금을 낸 적이 없는 이들이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든, 어디로 낭비하든 관심이 없을 것이고 그들이 국회의원이 된 후 국가예산을 자기 돈처럼 펑펑 써대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들이 적정세금을 꼬박꼬박 낸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앞으로 국민들도 투표할 때 주소지로 배달되는 선거 홍보물에 있는 후보자들의 이력사항과 납세실적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바란다면 공직자의 자격요건에 일정액 이상의 납세실적이 있어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한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