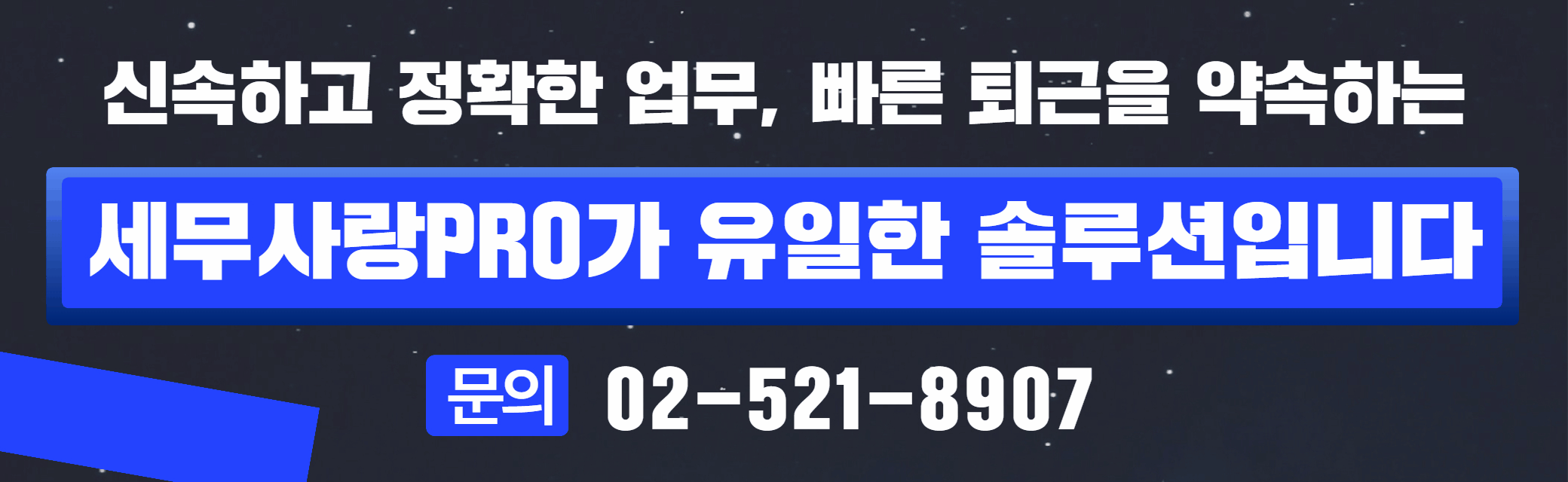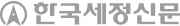“부임 후 의욕적으로 시도했지만, 떠난 후 알아보니 한 달도 채 못 돼 흐지부지 되고 없더라.”
“지시를 하니 따르긴 하는데, 자리를 뜨면 없어질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맞춰주는 셈이다.”
국세청이 6월말 명퇴 시즌을 맞음에 따라, 본청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전보인사도 순차적으로 단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일선 관리자로서 첫 발걸음을 떼는 복수직서기관의 경우 짧게는 20여년, 길게는 30여년 동안 체득했던 조직운영의 묘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고심의 정도가 깊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초임 서장 부임 후 조직의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새롭게 시도했던 운영방침이 1년 뒤 없어진 사례가 부지기수다.
자신의 뒤를 이은 후임 세무서장 역시 그 만의 조직관리론을 직원들에게 요구하고, 또 그렇게 1년여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억지춘향마냥 관서장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등 고역으로 변질되기 마련이다.
이유가 뭘까?
덕장(德將)으로 알려진 수도권 모 관서장은 성급함을 지목했다.
해당 관서장은 “직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조직운영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세정철학을 투영하지 말고, 그들의 삶 속으로 기꺼이 들어간 연후에 조직운영의 묘를 찾아낼 것”을 주문했다.
자신에게 꼭 맞는 옷이라도 남에게는 헐겁거나 불편한 옷이 되듯, 아무리 좋은 운영의 묘라도 직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 단명할 수 밖에 없는 이치다.
비단 초임세무서장 뿐만 아니라, 수차례 일선 세무서장을 경험한 이들은 물론 지방청장 가운데서도 자신의 기호를 앞세워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곤 한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존치·운영된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행정력의 낭비이자, 직원들에겐 말 못할 고역만 안긴 셈이다.
물론, 관리자가 자신의 세정철학을 실천하지 않고 온전히 임기만 채운 채 떠나는 것은 무사안일·복지부동과 동일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자신의 세정철학을 실천한다는 명분하에 직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일방형 질주에 나선다면 이는 비판의 대상임은 분명하다.
관리자에게 정말 필요한 건 지시가 아니라, 경청을 넘어 눈 내리는 소리마저 들을 수 있는 청설(聽雪)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