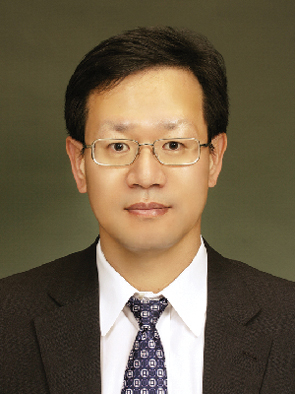
사람들이 금융위기의 고통에서 천천히 벗어나자 원전리스크가 그 자리를 다시 차지했다. 금융위기가 글로벌했듯이 원전위기도 일본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방사능이 옮겨올 뿐만 아니라 원전사고도 어디서나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 사고 발생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뿐 아니라 먼 유럽에서도 원전리스크와 미래의 에너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진보적인 미국의 경제학자 Stiglitz 교수가 금융위기와 원전사고의 유사성을 한 칼럼(Gambling with the Planet)에서 잘 묘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투자은행들의 파생상품의 경우처럼 에너지 산업체들의 원자로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도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생상품을 기획하고 그 리스크를 심사한 뒤 고객에게 판매한 투자은행의 당사자들처럼 원전 설계자들과 관리자, 정치가들은 이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것인가? 아니면 신이 아니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란 말인가?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 경험의 스펙트럼 외부에 위치한 리스크라면 그 존재와 개연성을 인지하기는 어렵다. 이를테면 일본 원전사고의 경우 쓰나미가 이에 해당한다. 인지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라면 리스크는 통상적으로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많다.
개인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정도의 파장을 갖는 리스크가 아니라 원전사고나 글로벌 금융위기같이 그 효과가 치명적이라면 이에 대한 대처는 특별해야 한다. 리스크가 저평가될 개연성에 생각이 미치기에는 개인에게 인센티브가 부족할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무는 국가의 업무범위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Stiglitz 교수는 전문가들이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무시하면서 희망적으로 리스크를 낮게 평가하는 행태를 보이는 이유를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평상시에는 만족스러운 이윤이 보장되고, 만일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피해는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길 수 있다면 이러한 리스크의 무시로 인한 사고 유발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익 사유화, 손실 사회화'의 구조에 대하여는 Stiglitz 교수 이전에 독일의 경제학자 Sinn이 그의 저서(Casino Capitalism, 2010, Oxford)에서 설명한 바 있다. 투자은행들이 차입자본으로 레버레지를 늘려 고위험·고수익 대상에 투자하면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일에 은행이 도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므로 그 투자자본의 범위 내에서만 손실은 국한되며 손실의 대부분은 사회화된다는 것이다.
투자은행들은 평소에 충분하게 확보한 이윤으로 자본금의 여러 곱절을 사유화(CEO들에 대한 높은 보상금과 주주들에 대한 풍족한 배당금으로)했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 자본금을 날려도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출발하는데 문제가 없다.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적 구조가 이를 가능하게 해주고 게다가 정부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두려워 하면서 대형 은행들의 도산을 재정자금을 동원해 막아주기까지 하면 모든 경제적 피해는 납세자와 정보가 부족한 소액 투자자들에게 전가되면서 '이익 사유화·손실 사회화'의 투자모델은 거의 완벽해진다(High Return/No Risk).
원전사업의 경우도 이익은 해당 기업의 몫이지만 사고 발생시의 피해는 주변지역의 거주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익 사유화·손실 사회화'의 구조가 적용됨은 물론이다. 후쿠시마 원전 피해자들에 대해서 도쿄전력은 가구당 약 1,200만원 정도 배상하겠다고 한다.
원전사업의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문제는 금융리스크의 관리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재생에너지에는 아직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며 그때까지는 화석연료만이 원전의 대안이다. 원전분야의 결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보의 비대칭문제는 금융리스크의 경우보다 심하다. 때문에 원전 로비스트들이 활동하기에도 유리한 환경이다.
정보문제가 왜곡되고 대중에게 객관적 진실이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하면 민의(Consensus)가 형성되기 어렵다. 국가는 이러한 문제에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민의를 묻는 것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비용이나 혹은 원전을 유지하다가 혹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서나 부담은 결국 이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