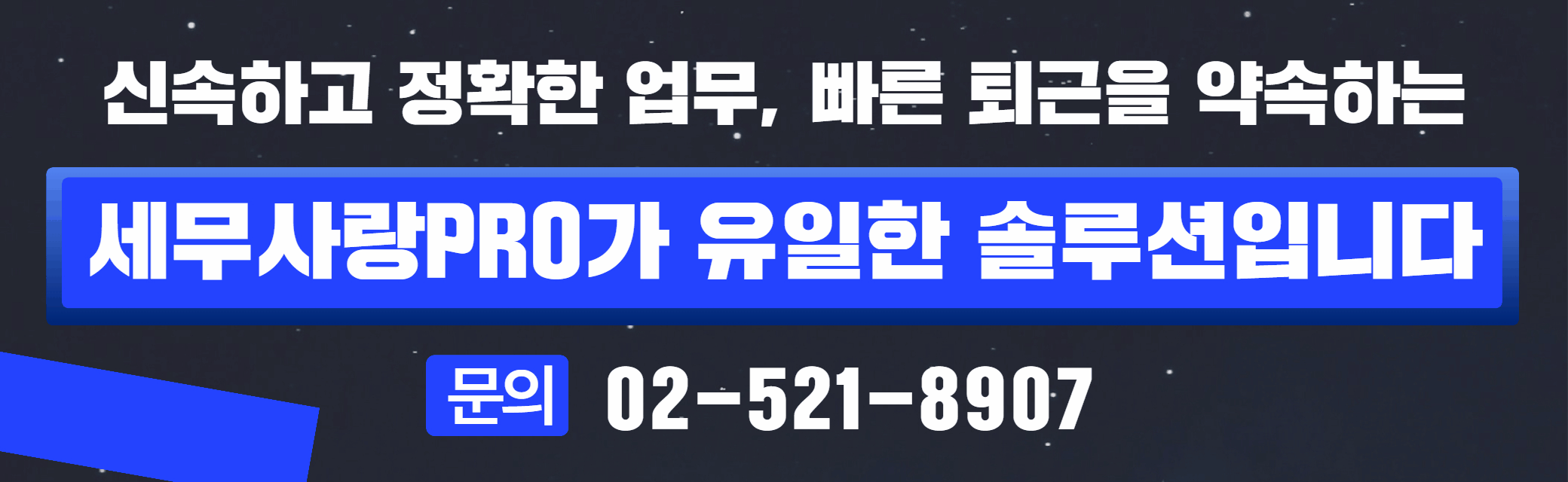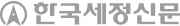83. 그렇다면 일선으로 보내 주십시오
'99년에서 2000년으로 바뀌어도 단지 달력만 다시 바꾸어 달았을 뿐, 그 해와 그 달, 그 별, 그 사람들, 그대로 변한 것이 없는데 뭘 그렇게 방정들을 떨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
2000년이 되면 팔자 고치는 일이라도 있는가?
모든 것을 포기한 지금, 밀레니엄(millennium)은 어글리(ugly)한 2000년으로 변해 내 바로 앞에 다가와 있었다.
6월 중순쯤이었는가 보다.
청장님이 또 찾으셨고 또 물으셨다.
"이제 마음잡고 일하고 있느냐?"
"예"
"알았어."
"청장님 저 그냥 일선으로 보내 주십시오."
"6개월이나 일년쯤 더 근무하다 세무사 개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장님이 나오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
청장님은 며칠 뒤에 또 부르셨고 또 물으셨다.
"박 과장 도대체 진심이 무어냐?"
나는 이제 승진도 포기하고 공직생활을 접겠다고 결심한 마당에 지금까지 주저하며 말하지 않던 개인사정(個人事情) 얘기를 새삼 말씀드려서 심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냥 내보내 주십시오"하고 나와버렸다.
잠시 뒤에 또 오라신다.
"갈만한 자리가 강남의 K서와 S서 두 곳이 있어."
"청장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렇게 나는 본청 생활을 졸업하고 삼성서로 오게 됐다.
2000년7월3일이었다.
일선에 나오고 보니 나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고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첫째는, 본청에서 승진을 바라며 뭐 빠지도록 일했는데 이제 그걸 포기한 데서 오는 허탈감. 승진을 포기한 공무원은 더 이상 공무원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됐다.
둘째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직원들이 무슨 부귀영화를 보려고 일선에 나왔나 하는 따가운 시선이다.
셋째는, 서장실에서 한다는 일이 대납세자들을 초청해 놓고 '세무사 개업하면 고문이라도…'하면서 비굴한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의 자존심이 도무지 허락을 하지 않았다.
넷째는, 기관장으로 나오고부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만 넘겨주면 쉽게 물러나겠다며 더욱 기승을 부리는 저쪽의 공갈협박이다.
이제는 사정기관에까지 찾아가서 압박을 해댄다.
총리실에 파견근무하다 돌아온 D사무관이 내용을 알아보고 와서는 계속 근무하려면 저쪽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나는 무시해 버렸다.
솔직한 말이지 이게 무슨 큰 죄인가?
어떻게라도 며느리를 포용하려 애쓰시던 부모님, 그리고 모든 가족들은 막가파식으로 나가는 그들 앞에서 두 손을 든지 오래다.
그들의 요구가 지나치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공무원이라는 약점(?) 때문에 이런 수모를 참고 시달려야 하는가?
그렇다면 사표를 내 스스로 그 약점을 제거하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청장님과 상의를 해보려고 본청으로 갔다.
나는 청장실로 올라가려다 그냥 세무서로 되돌아 와버렸다.
이미 내가 오래전부터 승진의 기회도 포기하며 결심한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됐다.
납세지원과장에게 사직서 접수를 부탁했다.
청장님이 전화를 주셨다.
"박 서장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 손으로 수리를 해서 미안해."
"수리하셨으면 왜 전화를 하십니까? 아우님 형님 사이라면 그전에 저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포기한 지금, 밀레니엄(millennium)은 어글리(ugly)한 2000년으로 변해 내 바로 앞에 다가와 있었다.
6월 중순쯤 이었는가 보다.
"그들이 악의적으로 한 말만 듣고 똥 무더기 치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하고 전화를 끊었다.
어찌보면 저쪽과 제일 결정적인 시기에 제2개청으로 야근·특근을 밥 먹듯이 하도록 일을 시킨 청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며칠전에 청장님과 단 둘이서 점심을 같이 하는 기회가 있었다. 국세청을 나온지 7여년만에 뵙는 자리였다. 밝고 건강하셨다.
나는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드렸고 그분은 안타까워하셨다. 진정한 아우님으로 생각하셨다면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나를 직접 불러서 전후(前後)전말을 들어봤어야 마땅한 것이었으며 그렇지 못한 청장님의 처사를 나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안해 하면서 "그런 심각한 정도였다면 미리 말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임에도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을 보고 소문이 사실일거라고 지레 믿어버렸다고 하셨다.
사실 사전(事前)에 미리 말씀을 드렸더라면 해결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또한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기에 미안해하실 것이 없다고 오히려 위로를 드렸다.
그렇게 2007년7월6일 청장님과 나는 그간의 오해를 서로 풀었으며 어느새 형님·아우님 사이로 다시 돌아와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84. Good-bye 국세청이여
직원들 보기에 정말 죄송했다.
퇴임한다고 식장을 만들어 전 직원이 참석까지 했는데 나는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퇴임사를 쓰지 않았다.
나는 그냥 단상에 올라갔다.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누구는 퇴임식에서 많은 눈물을 흘린다고 했지만 나는 어제저녁 어머니 곁에 누워 실컷 울어버린 때문인가?
아무런 마음의 동요없이 차분하기만 했다.
나는 33년 동안 내가 느끼며 당부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말을 했다.
"이제 33년 1개월 대장정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내리려 합니다."
"이성을 잃고 오직 본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은 저는 절대로 후회하거나 아쉬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훌훌 털고 나의 참된 인생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나가는 마당에서 멋있는 세무공무원이 되는 방법을 몇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한 일들, 그리고 하지 못해 아쉬운 것 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때 한 말들을 이 글의 마지막 편 '끝을 맺으며'란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직원들의 이별박수를 받으며 홀가분하게 청사를 떠났다.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국세청인데….
Good-bye!
Bye-Bye 국세청이여 !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