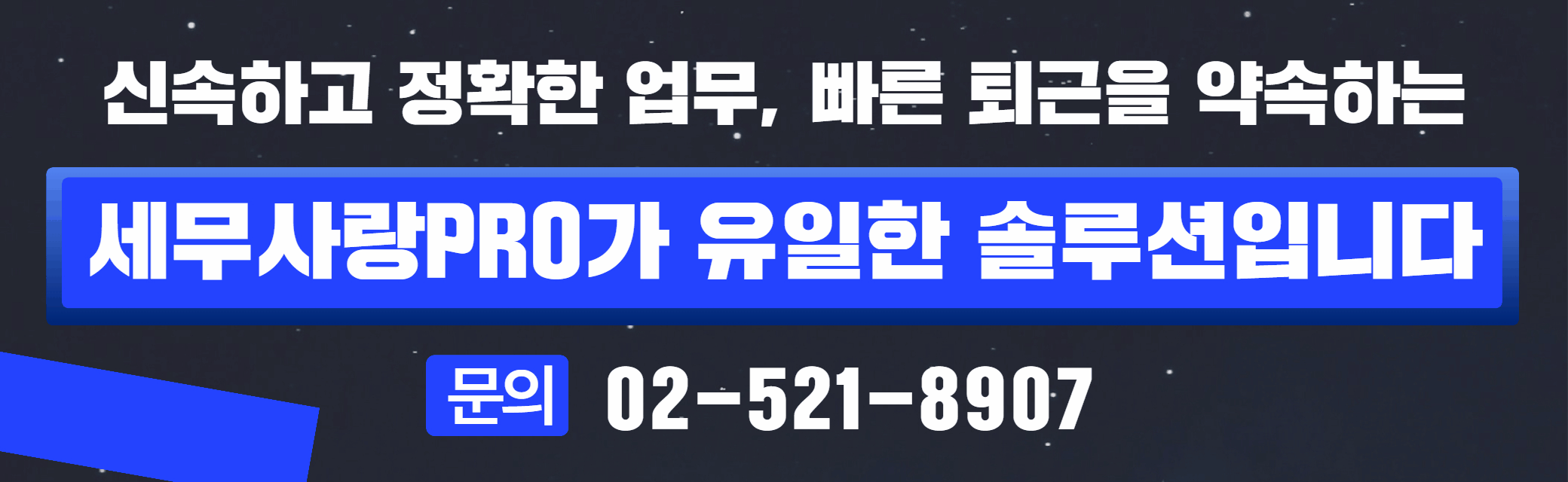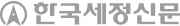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임명되자마자 한 것은 이른바 '국세청 개혁작업'이었다. 예를 들면, 국세행정위원회 설치, 납세자보호관제도 정비, 대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의무화 등이 그것이다. 무슨 일을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시비를 걸 이유는 없다. 개혁(改革)의 사전적 의미는 '불합리적인 것을 새롭게 뜯어 고치려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개혁은 중단 없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신임 국세청장이 제시한 개혁방안은 국세청이 본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한 것을 제대로 가게 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니만큼 앞으로 기대도 크다.
국세청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면서 납세자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납세자 보호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기간 동안의 세무행정은 세금의 부과와 징수라는 본질(本質, essence)보다는 납세자보호, 경제 살리기, 친절봉사, 부정부패 근절, 친환경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세무행정의 현상(現象, phenomenon)에 보다 치우쳤다면 너무 심한 판단일까? 납세자 보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하다. 그러나 국세청 업무상 세금부과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앞뒤가 바뀐 것이다. 본질에 자신이 없으니 자꾸 현상을 '포장'해서 정치권에 좋게 보이려고 하는 데서 국세청의 개혁이 꼬이게 된 것 아닌가?
어느 국내 유수한 민간기업의 CEO 얘기이다. 새로 취임해 개혁안을 내라고 하니까 중역들이 '그럴싸한'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한 개혁작업의 첫번째는 사무실에서 회사 중역의 책상을 다 치워 버렸다는 것이다.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문제점을 직접 보고 그곳에서 해결하라고 했다고 한다. 회의를 할 때는 온갖 좋은 프로젝트를 발표하지만 정작 실행은 안하는 것이 그 회사의 문제점이었고, 이를 간파한 CEO는 사람 먼저 개혁을 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짐 콜린스(Jim Collins)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라는 책을 보면, 좋은 회사를 위대한 회사로 도약시킨 리더들의 특성을 분석했는데, 그들이 맨 처음에 한 일은 "적합한 사람들을 버스에 태우는 일 그리고 부적합한 사람들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는 일이었다. 그러고 나서 버스를 어디로 몰고 갈지를 생각했다"라고 쓰고 있다. 즉, 사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조직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직에 '적합'한 사람을 골라내어 버스(본질)에 태우고 부적합한 사람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를 설명할 때 흔히 인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파레토 법칙(Pareto principle)을 든다. 이는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20% 개미만 일을 하고 60%는 일을 하는 채 하며, 나머지 20%는 수수방관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증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버스가 진흙탕 길에 빠졌을 경우, 실제 팔을 걷어붙이고 차를 미는 사람은 20%에 불과하고, 60%는 차를 밀자고 소리는 치지만 뒷짐을 지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국세청 개혁에 빗대어 설명하면, 지방국세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에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80%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 진다. 나무에 비유하면, 조직은 나무껍질이고 사람은 그 안의 세포이다. 나무껍질은 나무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영양분을 세포가 나뭇가지에 골고루 전달하는 것을 보호하는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무껍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 조직 개편도 이러한 이치에 맞추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국세청은 개청 이후 지난 40여년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가 예산을 성실하게 조달했던 우수한 인재와 아울러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했던 소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의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과거의 영광스러운 전통과 업적이 사라지지나 않을지 염려된다.
이와 같은 개혁의 출발점과 종점에 국세청장이 있다. 국세청장이야말로 세금을 걷는데 '도사'이어야 한다. 좋은 일화가 있다. 남북전쟁시절 링컨의 북군은 남군의 리(Lee) 장군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 술주정뱅이인 그랜트(Grant)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왜냐하면 그는 타고난 '싸움꾼'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연한 결정이었다. 아니 전쟁의 총책임자가 싸움을 모르는 '순둥이'라면 어디다 써먹을까. 링컨은 그의 개인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작전을 펼 줄 아는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링컨의 선택은 결국 승리를 가져왔고 노예제도가 폐지됐으며 그 연장선 상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있는 것이다. 이토록 '적합한' 한 사람이 그 조직과 민족의 흥망을 바꿀 수도 있다.
국세청장이 이와 같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임명권자를 비롯해 권력기관 등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소신껏 행정을 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예를 들면 임기보장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장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국세청장에게 대놓고 연락할 사람은 권력기관, 언론기관, 재벌 등일 것이다. 대부분 '잘 봐 달라'는 것 아니겠는가. 이를 과감하게 뿌리쳐야 개혁이 시작된다. 한술 더 떠서 '당신들 세무조사해야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그들에게, 자신의 영달을 위해 '세무조사해 보니 요런 것도 있습디다'라고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국세청 개혁은 물 건너간 것이다.
개혁은 시대가 변하듯이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개혁의 시작은 국세행정이 국세청의 본질과 벗어나 있는 것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조직의 개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인 것은 국세청 조직원이 개혁에 '적합'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시작도 국세청장이고 마지막도 국세청장이다. 다시 한번 국세청장 부임을 축하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