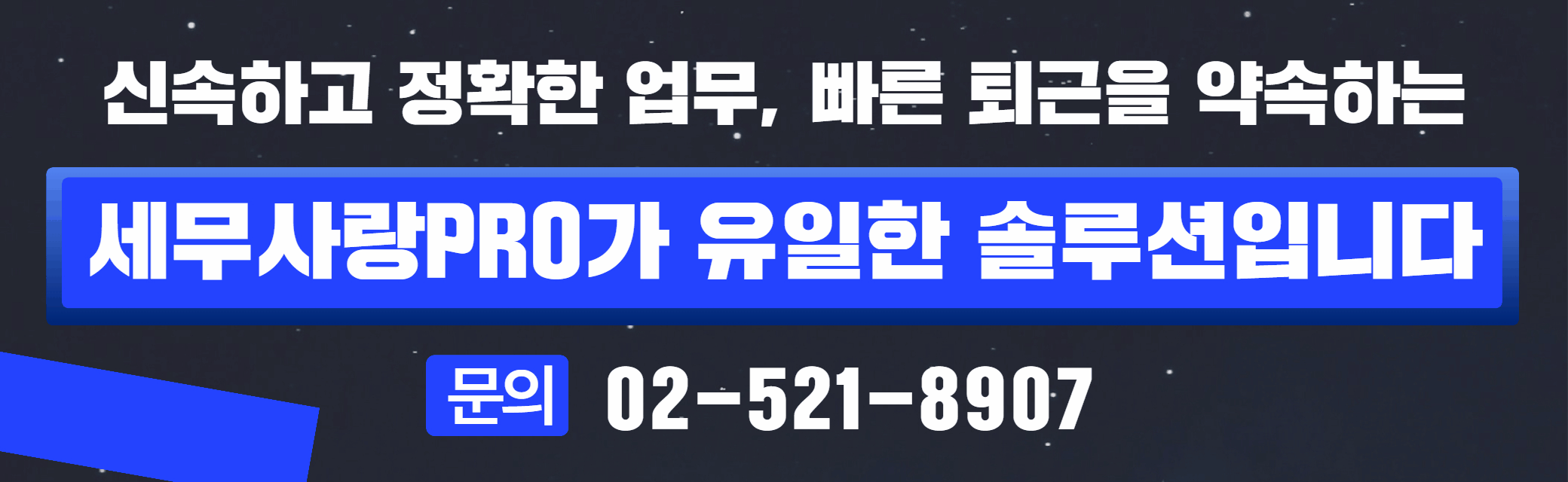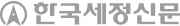상류의 오탁(汚濁)으로 인해 시시하게만 알았던 영산강 하류(榮山江 下流)에 이런 절경(絶景)이 있었으니…. 강폭이 넓고 물이 맑아 주변의 경관(景觀)도 이처럼 수려하니 호남의 금강(錦江)이라 이름지은 이곳 옛사람들의 해박(該博)과 슬기에 그저 탄복을 금할 수가 없었다.
전북 내포평야(內浦平野)를 거쳐 군산항에 이르는 금강하류에서도 이런 빼어난 경승(景勝)을 나는 본 일이 있다.
전남 나주군 다시역(多侍驛)에서 동남쪽으로 5km남짓, 이제 막 추수(秋收)를 끝낸 연도(沿道)의 크고 작은 마을들은 보기에 무척 안온(安穩)하고 평화롭기만 했다. 작반(作伴:길동무)은 심허(心許:마음을 준 친한 친구)의 오랜 친구 李형과 Y여사와 나, 그 지방에 사는 李형의 친척이 바쁜 가사(家事)를 제쳐 놓고 우리를 안내해 주셨다.
알고 보면 이날의 행차(行次)의 목적은 단순한 행락(行樂)일 수만은 없었다. 어진 선현(先賢)이 몸소 지으시고 글짓고 자적(自適)하신 강 위의 명루(名樓) 석관정(石串亭)을 찾아 그 유덕(遺德)을 기리는데 뜻이 있었다.
계절도 청명(淸明)의 가을 '정하(亭下)'를 흐르는 푸른 강류(江流)는 끝없이 맑고 냇가에 우거진 갈대밭 속에서 금방 기러기 우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청량(淸亮)한 정취를 느낀다.
강반(江畔)의 명정(名亭) 석관정(石串亭)은 그 강가에서 가파른 오솔길을 올라 높다란 언덕 위에 고즈넉히 자리잡고 있었다. 조선조 중종(中宗)때 신녕현감(新寧縣監)을 지낸 함풍 이씨(咸豊 李氏)의 현조(賢祖) 이진충(李盡忠) 선생이 짓고 그 후손인 참판 이시창(李時昌)공이 중건(重建)해 오늘에 이른 이 정자는 석관정(石串亭)이란 이름 그대로 첩첩이 쌓인 석등(石嶝:돌 비탈길) 위에 위치하고 발밑을 유유히 흐르는 푸른 물결은 흡사 부소산 낙화암(扶蘇山 落花岩) 밑을 흐르는 백마강(白馬江)의 기경(奇景)을 방불케 한다.
점심 때가 돼 들고 간 포저(苞저:심사품)를 서늘한 석상(石狀) 위에 풀었다. 주고 받는 술잔에 흥취(興趣)는 자못 점양(漸揚)하고 담론(談論)에는 조금도 허물이 없으니 추천단일(秋天短日:가을 해가 짧음)이 그저 원망스럽기만 했다.
해가 기울자 풀숲속 여기저기서 가을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일기 시작한다.
강가에 점점(點點)이 자리잡은 조객(釣客:낚시꾼)들도 하나둘씩 낚시대를 거둬 챙기고 원행(遠行)인듯 강둑에 늘어선 자가용차들이 부산스레 시동(始動)을 건다.
그러나 우리는 서두를 것이 없다. 비록 타고 갈 차는 없을지언정 같이 손을 잡고 Y녀(女)는 들꽃을 손에 들고 시골길을 거닐 수 있는 다정한 벗이 같이 있고 표저(瓢底:술병 바닥)에는 아직 출렁임이 남아 있다.
자세히 보니 강 건너 저쪽 높다란 산 중턱에 또 하나 큼직한 정자가 서 있다. 시간이 있으면 가보고는 싶지만 사일(斜日:기운 해)은 괘서(掛西:서쪽에 걸려 있다)이니 다음날을 기약하고 아쉬운 귀가(歸家)길에 올랐다.
註:석관정(石串亭)은 나주 다시면(羅州 多侍面)에 있는 李庸燮 國稅廳長의 一門 함풍 이씨(咸豊 李氏) 소유(所有)의 강반미정(江畔美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