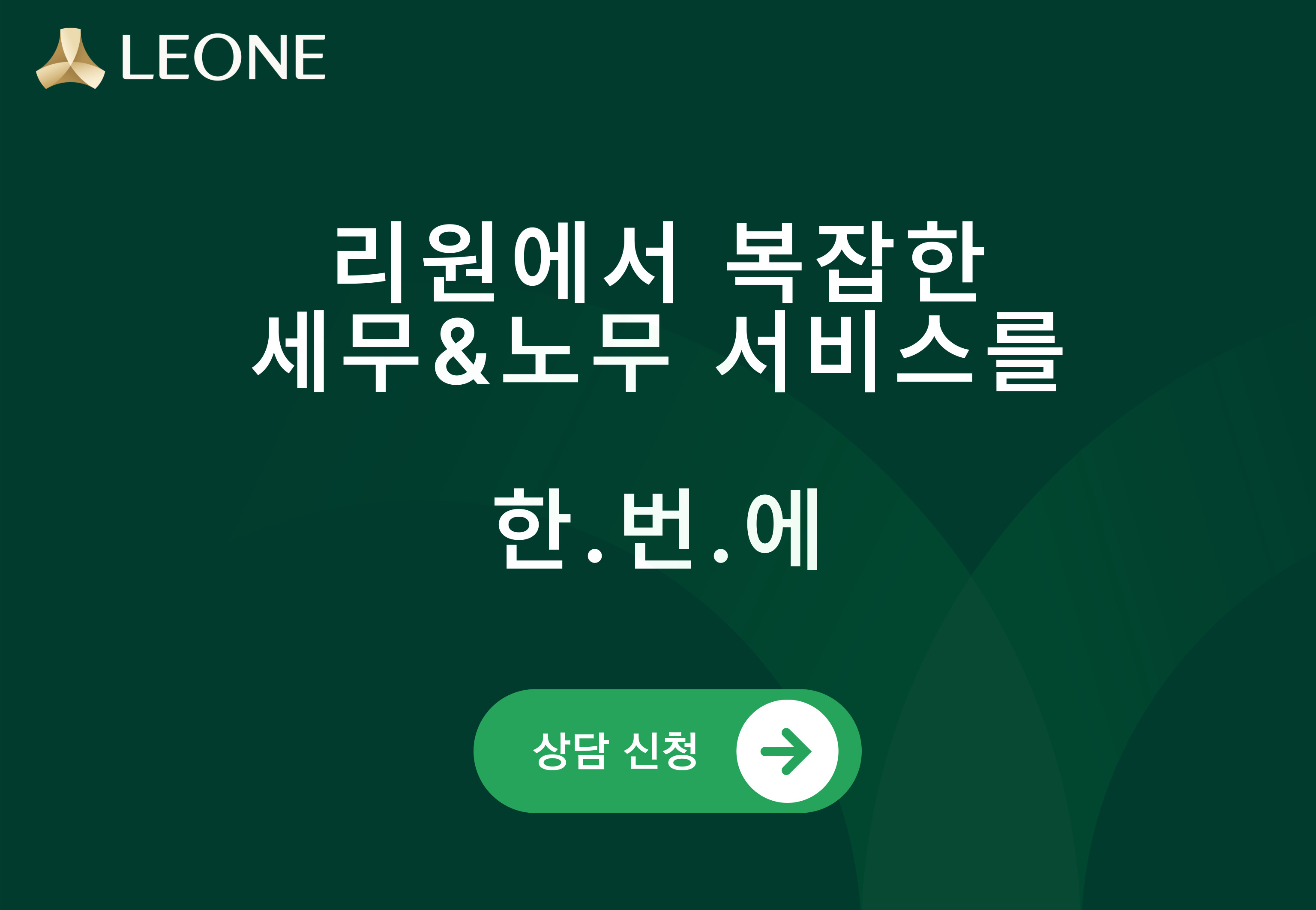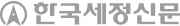금융감독원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감독 체계 구축에 나섰다.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대부업체까지 이관 받게 되면서 금감원이 관리하게 될 대부업체는 500여곳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대부업 감독을 위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대부업을 이관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대부업감독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제안서 제출 기한은 29일까지로, 금감원은 기술과 가격 평가를 마친 4월6일 이후에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오는 7월25일부터 금감원이 감독하게 될 대부업체가 대폭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금감원의 직권 검사 대상이 되는 대부업체를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곳으로 정하기도 했다.
대부업 감독시스템 구축 작업은 7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지자체로부터 데이터 자체를 넘겨 받는 것은 이관에 임박해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DB를 통합하고, 감독 대상을 데이터화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기초부터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기존 대부업에 대한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와 금융당국이 이원화해서 진행해왔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금감원이 직접 감독해야 하는 대부업체는 500여곳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대부업에 대한 감독 권한이 지자체에서 금감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기존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던 것 대비 일원화된 대응 체계는 갖출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대부업법 일몰로 과다 금리 논란이 있었던 지난 1월초와 같은 경우 감독 당국 차원에서 일원화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 초 대부업체 감독은 저축은행 감독국이, 검사는 은행·비은행 소비자보호국이 맡도록 조직 개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독 대상 기업이 대폭 늘어나고, 작은 업체들이 많은 대부업계의 특성상 업무 부담이 급증하거나 적절한 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 권한 자체도 지자체에 있었던 경우가 많아 대부업체가 애매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손을 대기 어려운 부분은 있었다"면서도 "문제가 되는 곳들은 작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이 크게 늘어나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