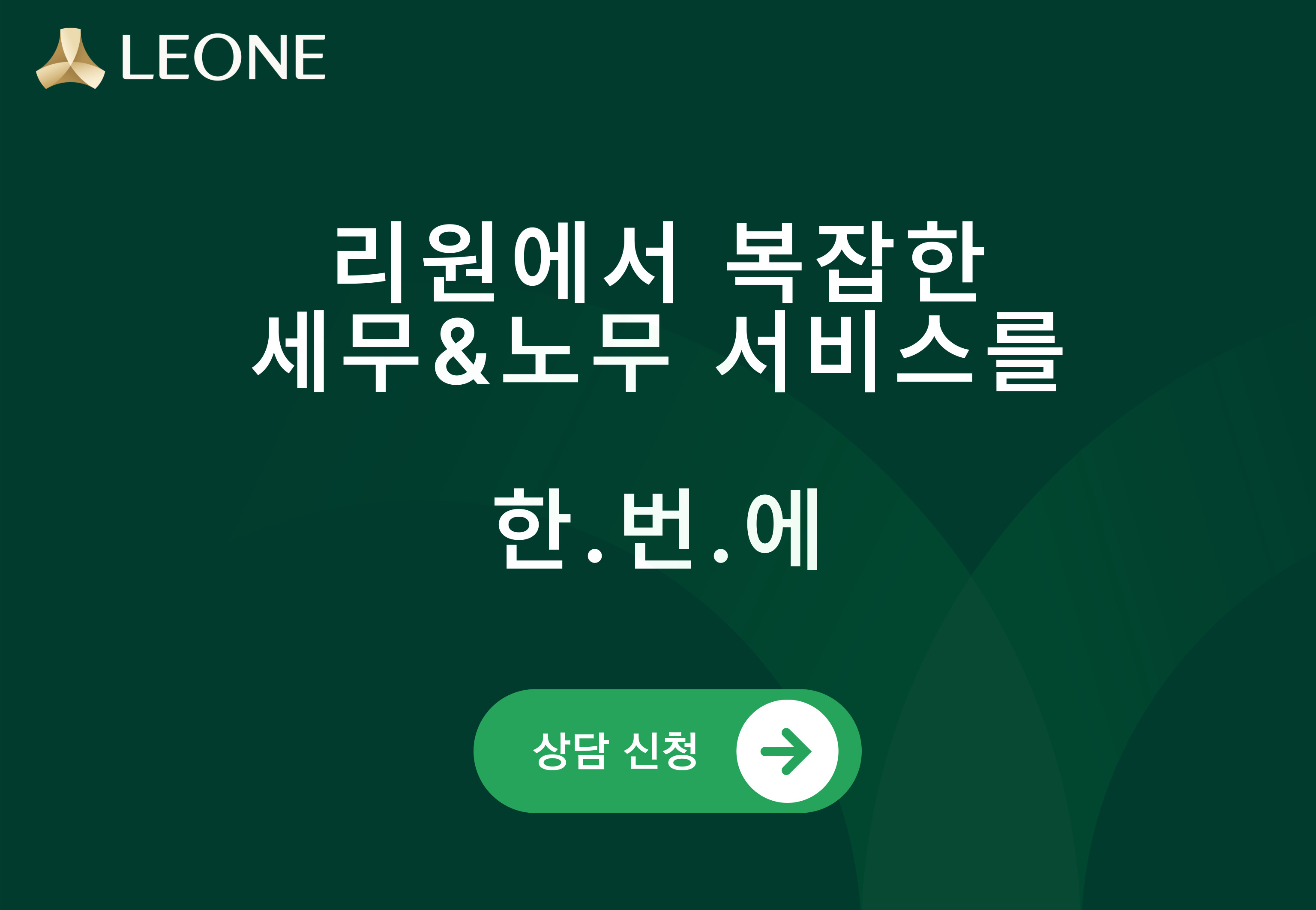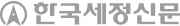201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의 영예는 아카사키 이사무(赤崎勇·85) 교수와 아마노 히로시(天野浩·54) 교수, 나카무라 슈지(中村修二·60)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밝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백색 광원 개발을 가능케 한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발명한 일본 과학자들이다.
국내 학자들은 노벨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예견된 일이라면서도 업적 기여도 측면에서는 나카무라 교수의 공을 더 높이 샀다.
이들은 1990년대 많은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난제로 꼽던 반도체에서 밝은 청색광을 뽑아내는 데 성공했다.
1960년대 빛의 삼원색인 적색과 녹색 계열 광원은 관찰됐지만, 청색광이 없어 백색광이 만들어질 수 없었는데 3인의 발명으로 흰 빛을 창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리학계가 청색 LED 개발에 매달린 데는 적색과 녹색, 청색광이 결합돼 만들어내는 백색광 LED가 공해물질인 기존의 백열등이나 형광등보다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수명도 길어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 재직 중인 나카무라 교수는 기업체인 니치아(日亞) 화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1993년 세계 최초로 청색 LED를 개발해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회사에서 받은 대우는 고작 2만 엔의 포상금과 과장 승진에 불과했고, 특허 발명권도 회사에 귀속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나카무라 교수는 1999년에 회사를 박차고 나와 지금의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2년 뒤 나카무라 교수가 니치아 화학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인 것은 유명한 일화다. 청색 LED에 대한 특허권의 일부를 자신에게 양도하거나 발명 댓가로 20억 엔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재판은 2005년 8억4000만 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 액수는 일본 기업체가 개인에게 지급한 역대 최고의 보너스로 기록되고 있다.
소송 당시 일본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발명에서 연구원의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현재도 일본의 경직된 기업 문화를 언급할 때마다 등장하며, 개인 연구원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계기가 돼 이후 유사 소송이 잇달았다.
아카사키 교수는 현재 일본 나고야의 메이조대학 석좌교수로 있으며, 아마노 교수도 같은 대학에서 2002년부터 재직 중이다. 청색 LED 연구 당시 이들은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였다.
서울대 박영우 물리학과 교수는 "조명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꾼 발명으로 업적 공로가 지대하다. 특히 나카무라 교수의 경우 대학 교수로 초빙될 때부터 (상을 받을만한) 인물로 낙점됐다"고 말했다.
서강대 정현식 물리학과 교수는 "나카무라 교수와 나머지 2명의 교수가 비슷한 시기에 청색 LED를 경쟁적으로 연구하면서 상승 탄력을 받아 관련 분야 발전에 도움을 줬다"면서 "물리학에 기반을 둔 테크놀로지가 인류에 공헌한 기여도를 볼 때 충분히 노벨상을 탈 만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