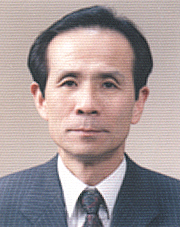
필자는 2011년4월11일 本紙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明과 暗'이라는 제목으로 문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 때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였으므로 시행 결과를 예측해 장단점을 비교해 봤는데 2011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음달로 접어들자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우려를 누구보다도 실감하는 사람은 세무사들이다. 정부는 조세수입에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 크게 걱정하는 것 같지 않고 납세자는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잘 모르겠으니 긍정도 부정도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어차피 성실하게 신고해 오던 사업자는 자기의 성실을 의심하는 것 같으니 오히려 불평이고 별도의 보수도 줄 것 같지 않다. 그러하니 이 중간에 낀 세무사만 납세자와의 수임문제의 원활한 체결이 어렵고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려가 쌓이는 현상이다.
첫째, 신고납세확정제도가 후퇴하는 것 아닌가? 신고납세제도야말로 민주세제의 꽃이라고 했다. 자주적이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稅目 중 개인 사업소득에만 적용하고 그 중에서도 특정 종목의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보편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하는 민주제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점점 확대돼 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신고납세제도는 그 입지가 좁아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형평성이 결여된 제도이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세상의 모든 일이 보편성을 갖지 못하면 진리로서 보장받기 어렵다. 우리는 1970 년대까지의 녹색신고제도를 기억하고 있다. 그 때는 조세수입의 증대에 급급한 나머지 정부가 일정수준의 기준을 제시해 그 수준에 미치는 소득을 신고하면 조사의 유예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이 제도가 일부 납세자에게만 적용됨으로써 보편성을 잃게 돼 정착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축적돼 신고납세제로 발전하는 발판이 됐던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녹색신고제도의 모양을 바꾸면서 납세자의 자율성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세제로서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형평성에 어긋난다. 형평성의 원리는 보편성과 함께 사회질서 유지의 2大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형평성과 보편성이 지켜질 때에 정의로운 사회가 이룩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될 때에 조화와 순응의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같은 업종의 사업자 또는 같은 규모의 사업자에게 서로 다른 납세방법을 적용하면 어느 한 쪽은 괴리와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을 회피해 다른 사람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려고 꾀를 낸다. 여기에 바로 탈세 심리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납세 順應度를 떨어뜨려 조세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된다.
요새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구조를 두고 이른바 '1 對 99'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1과 99의 차등은 심각성을 대변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우리 세제도 보편성과 형평성을 갖지 못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넷째, 세무사의 대리행위와 책임의 한계가 애매하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 확인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制裁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성실신고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위임을 해야 되고 그 對價로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면 被위임자인 세무사로부터 과세관청의 조사에 준하는 실지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수준을 넘어서 원시적 기록과 증빙서까지 검색하지 않으면 성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납세자의 측면에서 보면 자기가 돈(보수)을 내면서 돈을 받아간 사람한테 조사를 받는 셈이 되고 반면 세무사는 자기에게 돈을 준 사람을 조사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보면 납세자와 세무사 간의 위임사무가 정상적으로 행해질 수 있을까? 다른 한편으로는 조사공무원에 준하는 성실도를 측정해 이 규정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또한 성실신고를 했다고 하여 조사가 절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니 이러한 과정에서 세무사가 성실 확인을 잘못하면 세무사를 처벌하겠다고 한다. 이 三者의 관계설정과 현실 인식이 성실신고제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과거의 녹색신고제도는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었다. 정부는 신고의 결과에 따라 녹색신고자로 선정하고 혜택을 부여하면 됐다. 따라서 납세자가 불안이나 불만을 갖지 아니했다.
세무사 또한 그러했다. 아주 마음 편한 제도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보편성이나 형평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실로 미뤄본다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