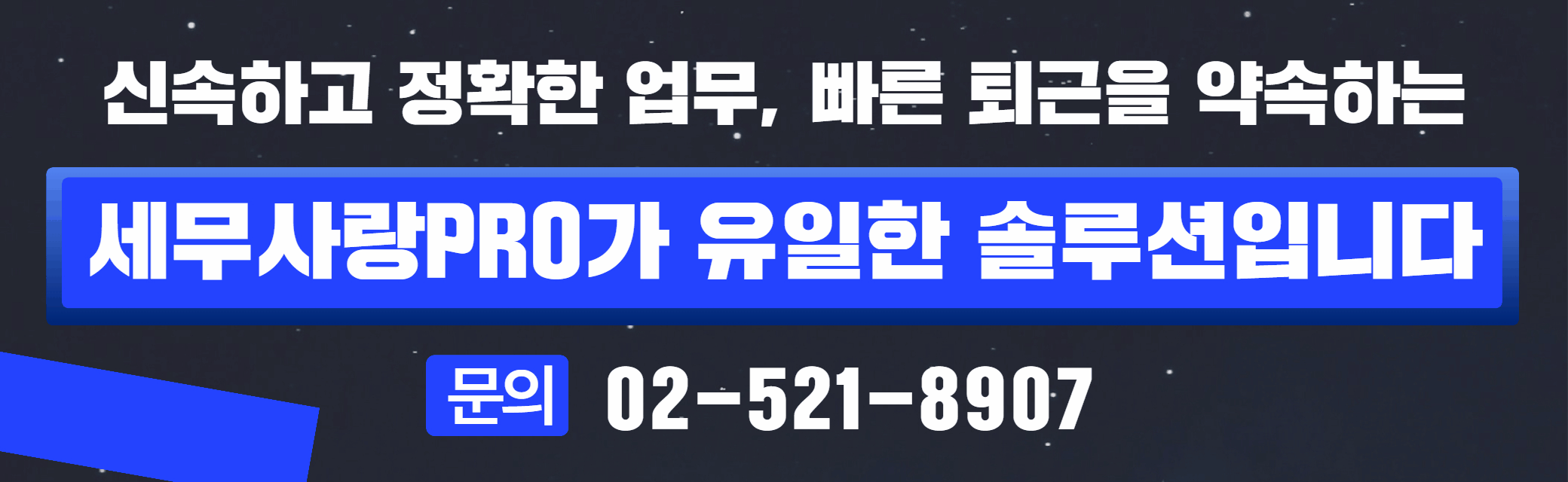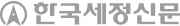금융결제원이 부도수표ㆍ어음 유통을 사실상 방치하려 하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좌거래정지 정보를 비공개에 부치는 결제원의 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최근 행정안전부 등과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제원이 관련 법령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유권해석 등으로 결제원의 시도를 백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좌거래정지 정보는 매일 결제원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거래 정지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를 공개한 배경은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 신용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어음과 수표 거래가 중지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천356명이었다. 하루 평균 16명씩 거래 중지 통보를 받은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표나 어음은 시장에서 전전 매매(여러 사람을 거쳐 유통된다는 뜻)가 가능해 부도 사실을 모르면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당좌거래정지 정보 제공이 차단되면 부도 사실을 알 수 없는 개인사업자는 많게는 1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제원이 그럼에도 정보 제공을 차단하려던 까닭은 지난해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이 법은 다른 법에 예외 조항이 없는 한 당좌거래정지 사실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결제원은 당장 오는 26일부터 정보 제공을 중단키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원장 보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실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 당좌거래정지 정보는 개인정보법의 예외 사항이 아니라는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제원의 법률검토는 허점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법 제6조는 `신용정보법 등에 예외가 없으면 이 법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신용정보법 32조와 시행령 2조에는 이와 관련한 예외가 명확히 적시돼 있다.
법 32조는 개인이 아니면(법인이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행령 2조는 개인 사업자도 기업으로 규정했다.
금융권에선 결제원의 이 같은 `무책임한 시도' 탓에 큰 혼란이 생길 뻔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결제 업무는 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인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뻔히 보이는 예외조항조차 못 봤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결제원은 은행들이 사원으로서 출자해 공공기관 성격을 띠지만 금융기관 범주에는 들지 않는 `견제의 사각지대'다.
결제원 관계자는 "당좌거래정지 제공은 공익적 측면이 강해 중단 여부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