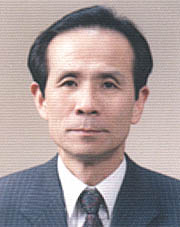
이러한 규제장치로서의 법규는 국가의 재정 확보와 과세의 공평이라는 차원에서 입법취지는 당위성을 갖고 있으나 그 규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내용이 불합리하다면 오히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세법 전반에 걸쳐 산재해 있는 바 국세기본법을 비롯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간접세법에 이르기까지 망라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제39조와 시행령 제20조의 친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즉 법인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바, 이 경우의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액이 50%를 초과하는 주주를 말한다. 문제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인데 1)6촌 이내의 부계혈족(父系血族)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3촌 이내의 母系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그밖에도 배우자는 물론 양가, 생가, 처가 5)또 이들이 출자한 다른 법인까지 오리발처럼 붙여서 과점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이를 두고 어떤 학자는 '경제행위 연좌제'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다.
필자가 이 대목을 강의하면서 6촌이 누구냐? 또는 3촌 이내의 모계혈족의 자녀가 누구냐?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젊은 사람일수록 대부분 모른다고 보는 편이 맞는 셈이다. 촌수 계산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겨우 4촌을 알고 있으나 4촌을 종항간(從行間), 6촌을 再종항간이라는 명칭은 더욱 더 알 길이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언론(한국일보, 2010.9.21)에서는 '핵(核)친족 시대'라고 이름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의식' 설문에 따르면 국민의 70%가 친족의 범위를 4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며 60세 이하의 젊은 사람일수록 그 비율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4촌 이내의 혈족이 일년에 만나는 횟수는 2회 이하가 44%이며 4촌 이내의 친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겠다는 사람이 86%로 나타났고 경제적 어려움이 처했을 때 부모 형제와 4촌까지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19%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의 핵친족시대에 재종(6촌)형제, 종(4촌)제수, 고모부와 고종사촌, 이모부와 이종사촌, 처남의 아내, 처가 동서들까지 달려들어 조세회피행위에 가담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신속하게 법률에 반영한 것은 1990년에 민법을 개정해 상속순위(제1000조 4호)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한 내용으로서 상속을 받을만한 연대관계에 있는 친족은 4촌 이내라는 뜻이다. 조세가 아무리 公共性이 강하다고 하드라도 의사의 연대 또는 경제행위의 연대를 기대할 수 없는 친족에까지 경제 단위의 동일체로 묶어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납세의무 연좌제'라고 이름 붙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요새 우리가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보는 사건은 재산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배우자와 이별하고 심지어는 부모와도 재판을 벌이는 광경이다. 극도의 개인주의 사회라는 것을 실감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내 4촌 제수가 또는 내 이종사촌이 어느 회사의 주식을 몇주나 갖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의 경제행위를 하나로 묶어 납세의무를 지운단 말인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을 벗어난 조치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또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 범위를 축소 조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