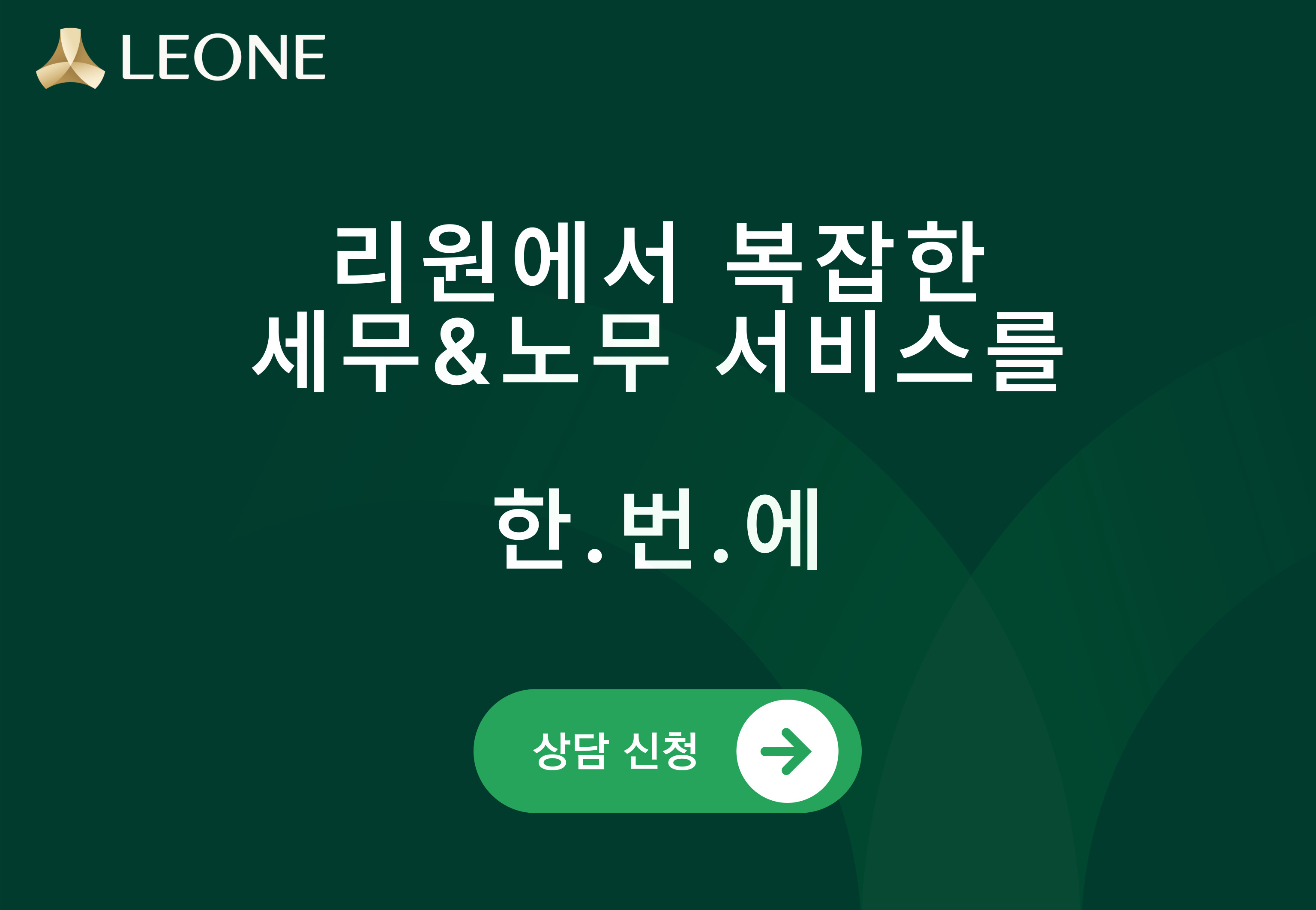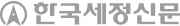파산 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면책 신청 과정에서 원본 채무만 기재하고 이자 등 부수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수 채무 또한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 선고를 알았다면 채무자는 파산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채무자가 원본 채무만을 기재해 면책 신청을 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면책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봐 면책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채무자 A씨가 "아파트가 대한주택공사로 넘어가도록 하지 않게 해 달라"며 채권자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파산·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로 B씨를 기재하고, 원본 채무 600만원을 기재했다"며 "이는 B씨가 파산채권자로서 A씨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B씨가 A씨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A씨가 원금 600만원 채무만 기재하고 이자 채무는 기재하지 않아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며 "이는 채무자희생법에서 정한 비(非)면책채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6년 7월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400만원 상당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B씨로부터 6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A씨는 돈을 갚지 못했고, B씨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에 넘기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2009년 10월 "A씨는 B씨에게 600만원 채무가 있으며 2009년 11월까지 연체이자 260만원과 그 이후 이자를 매달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지난 2013년 4월 인천지법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고, 같은해 6월 파산 선고를 받은 뒤 이듬해 3월 면책 결정을 받았다. 당시 A씨는 파산·면책 신청 당시 B씨 등 채권자들에 대해 원본 채무만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이자 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해 아파트를 넘길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면책되지 않은 이자 채무가 남아 있어 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게 넘길 의무가 있다"며 "악의로 이자 등 부수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