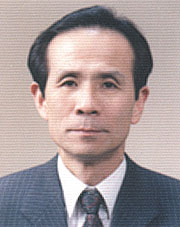
한국 세무사에게는 50년에 걸친 오랜 숙원이 있었다. 그것은 세무사법의 올바른 정리였다. 1961년에 제정된 세무사법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2011년에야 비로소 그 잘못을 바르게 고치는, 이른바 '改正'이 이뤄졌으니 꼭 50년만에 쾌거를 이루고 숙원을 풀게 된 것이다.
千載一遇의 기회를 만난 것이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것이다. 아니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들어 낸 것이다. 공자는 50에 이르는 나이를 '五十而 天命'이라고 했다. 한국세무사회가 50이 돼 '正道'가 天命임을 알게 됐고 천명이 세무사회의 손을 높이 들어준 것이다.
정도는 두 갈래의 길에서 찾아야 한다. 그 하나는 이미 제정된 세무사법이 불합리하거나 법리에 어긋나는 내용들을 수정해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세무사가 해야 할 일을 더 찾아내고 개척해 가는 길이다. 이 가운데 제1차적으로 비뚤어진 세무사법을 50년 만에 바로잡는 작업을 끝냈으니 이제는 제2차로 새로운 세무사의 영역을 찾아서 정착시키는 일이 또다른 숙제로 남아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주는 것을 금지시킨 것이다. 필자는 이미 本紙(2003년10월2일)를 통해 이 주장을 강조한 바 있다. 세무사는 국가의 목적 활동인 재정 조달과 납세자 보호라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지식과 소양을 시험하고 그 자격을 인증하는 면허인데, 이러한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사람에게 공짜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의 극치요, 위법의 표본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일정기간 이상의 국세경력 공무원에게 주던 자격도 이를 폐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제도의 취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50년이나 존치해 온 사실은 세무사법을 관리하는 주무관청이나 입법부 모두의 직무 유기이고 우리 세무사의 무능에서 비롯된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세무사에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우연히 찾아온 것은 아니다. 50년이란 세월이 거저 만들어 준 기회는 더욱 아니다. 창립회원 131명에서부터 1만명의 회원이 확보되기까지 수많은 회장, 임직원, 회원들이 각고의 노력과 정성으로 쌓아올린 저력의 금자탑이 기회를 붙들어 맨 결과이다.
徐廷柱의 詩 한 구절이 생각난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밤마다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세무사는 그 많은 낮과 밤을 울면서 지새워 왔다. 그 소쩍새가 울음을 그치고 국화가 만발하는 데는 點火가 필요했다. 불꽃심에 불을 붙이지 않고는 불은 타오르지 못한다. 이 점화의 극적 순간을 포착한 것은 鄭求政 회장이었다. 이 점화의 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국회에 가서 살았다고 한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염치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한다. 2011년12월28일, 마침내 1만 회원이 쉬지 않고 가꾸어 온 비옥한 토양 위에서 '改正'의 불꽃은 타오르기 시작하고 기나긴 50년 터널속의 한 시대를 마감한 것이다. 이 일을 두고 일본의 세무사계(稅理士界)가 부러워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서 한 수 배우자고 그 비책을 묻고 있다.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해낸 것이다. 세무사계의 청사(靑史)에 길이 빛날 높은 탑을 쌓아 올린 행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세무사는 이 장한 일을 뒤로 하고 다시 옷깃을 여미어야 한다. 앞을 내다보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세무사가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일이 많이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업의 경영진단업무를 맡게 된 것은 또 하나의 큰 수확으로서 제1차적 발굴 작업의 결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캐야 할 보물은 산적해 있다. 우선 급한 것은 세무사가 조세소송을 수행하는 일이다. 조세에 관한 제1의 전문가가 세무사라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법률이 이를 보장하고 판례가 또한 변호하고 있다. 변호사는 조세전문가가 아니므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 않는가 말이다. 조세에 관한 불복절차로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권 대리권까지 세무사에게 부여돼 있는데 그 다음 심급절차로서의 소송만을 대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이며 심보가 비뚤어진 사람의 정도를 벗어난 제도 아닌가?
다만 그렇게 하기에 한가지 애로가 있다면 세무사가 소송절차를 변호사만큼 잘 모른다는 헛점이 있다. 그러나 세무사가 행정심판절차를 익힌 마당에 소송지식을 조금만 더 보탠다면 소송이 가능한데, 절차적 이행을 이유로 실체적 판단을 소홀히 하거나 배척할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해 세무사는 공부를 더 하고 지식을 쌓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일이 당장에는 벅찬 일이라면 일본과 같이 세무사의 소송보조참가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소송대리의 길을 열어가면 될 것이다. 독일이 세무사소송대리의 본보기가 돼 있음을 他山之石으로 삼으면 될 것이다.
세무사의 역량이 결집되는 또 하나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아니 만들어야 한다. 정구정 회장은 또 한번의 밤을 설치고 나들이를 계속해야 한다. 또 한 번의 염치없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 된다. 또 한번의 세무사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