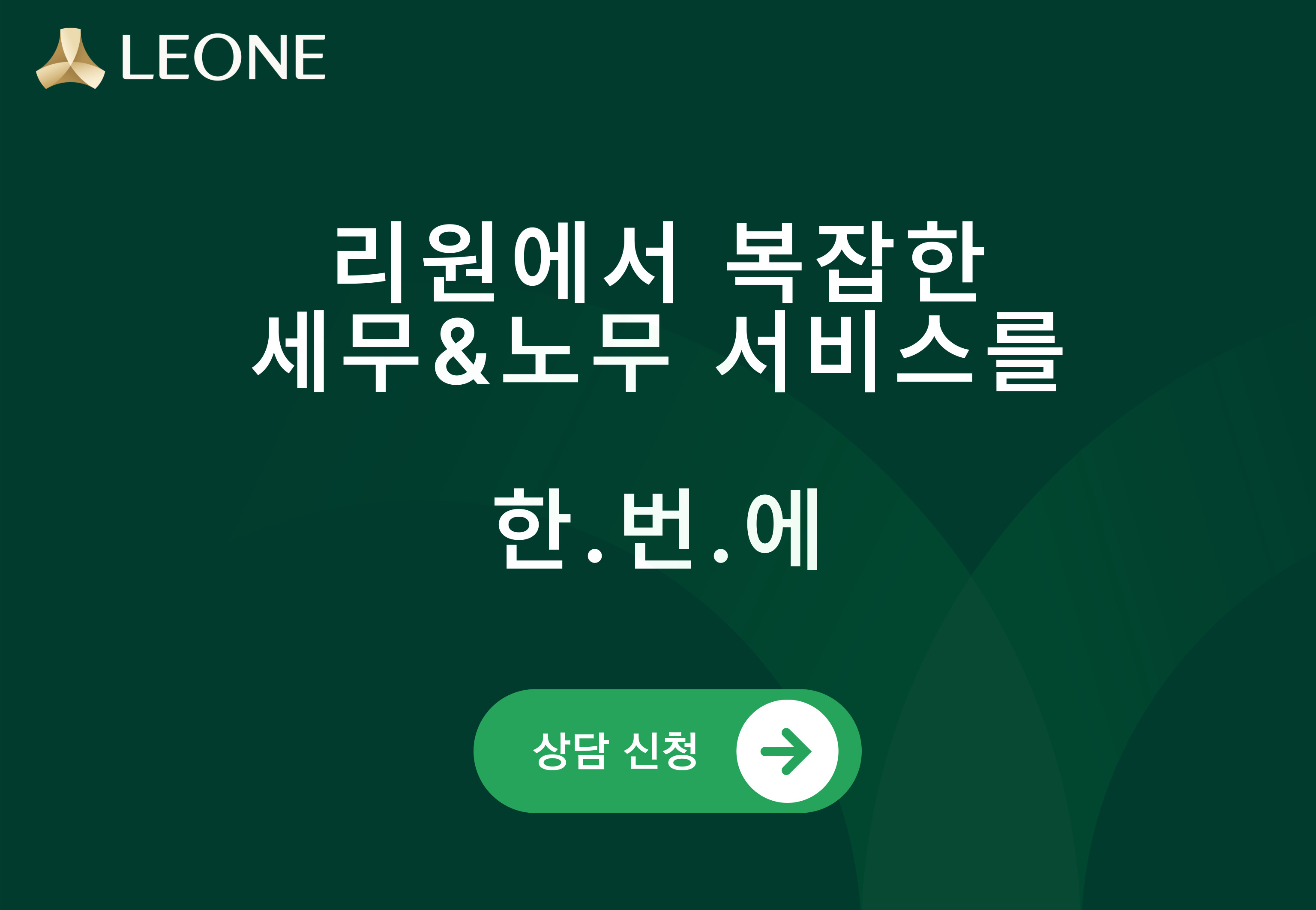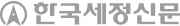부실 기업을 관리하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검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기관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구조가 양산됐다는 비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8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수출입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해 온 금융감독원은 2011년부터 종합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매년 1주 정도의 부문검사 만을 실시했다. 이 조사는 3~5일에 걸쳐 시행되는 자산건전성 검사로 단순한 결산검사에 불과하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현행 '수은법'상 수출입은행 업무에 대한 감독권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돼 있고,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경영건전성 감독에 국한해 제한적인 검사권한을 가진다.
더욱이 감사원은 수은 검사에 대한 범위,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감원 검사에 대해 구두상 간여했다.
감사원의 작업도 충분치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2010년 이후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넓은 부문에서 실시됐지만 '수출입 및 해외투자 금융지원' 부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수은과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엄정한 감독과 검사를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감사원과 금융감독당국이 정책금융기관 관리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일본 금융청이 4~5개월에 걸쳐 정책금융기관에 대해 심도 있게 모니터링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금융당국도 경영건전성 검사를 위해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