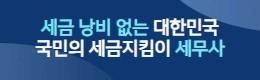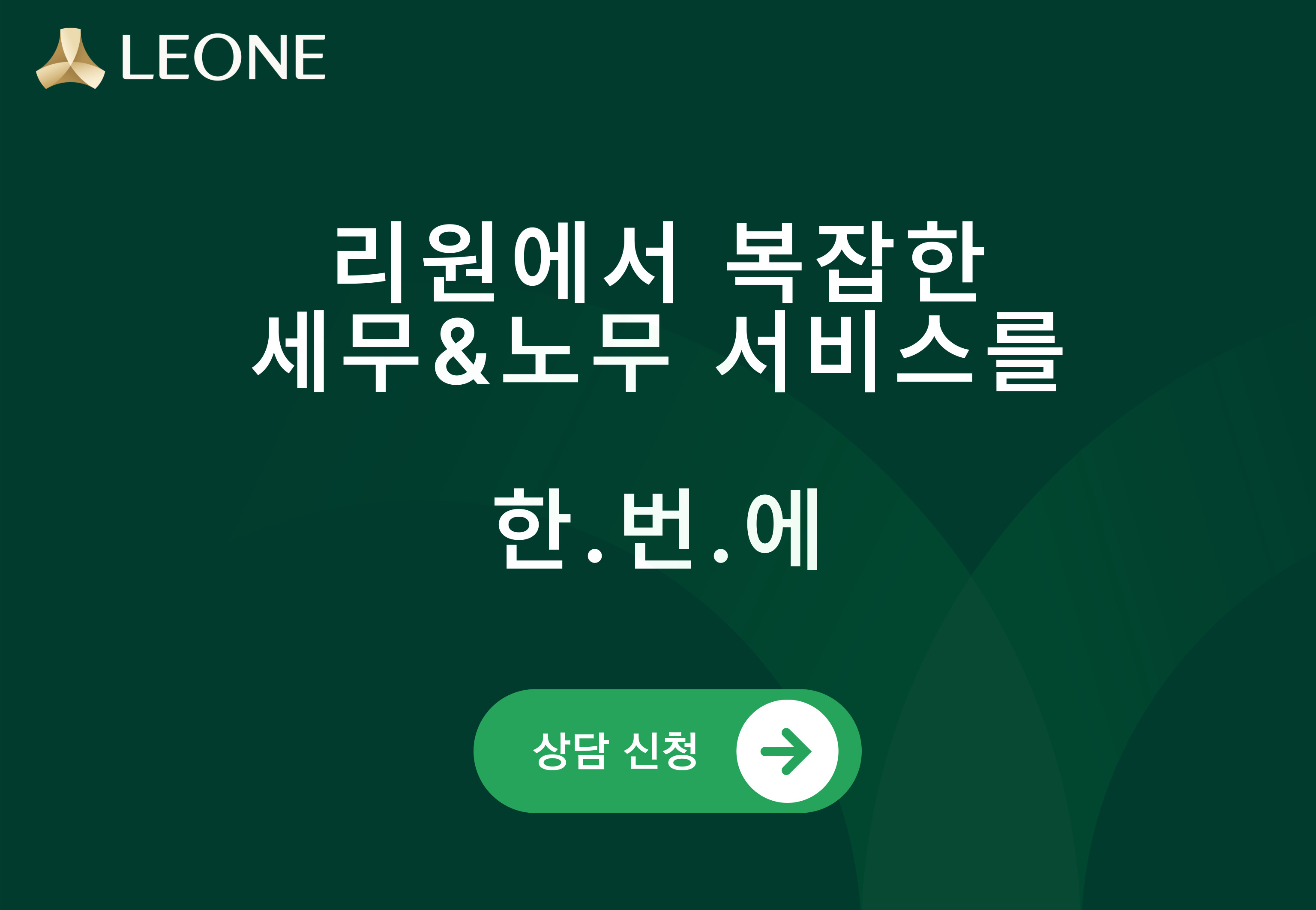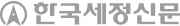백년만의 가뭄에 울안축대 틈바구니
바싹 말라 만지면 부서지던 이끼(苔)
허무하게 죽고 말았구나 했는데
비 몇 번 오고 나자
언제런 듯 시퍼렇게 되살아나
융단을 내걸은 듯
가슴을 펴고 활짝 웃고 있네
불씨보다 더 끈끈이 번지는 생명력
그냥 쉽게 보아넘기는 게 아니었어
하찮은 미물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지켜내는 저 지구력
매사 슬기로워 만물의 영장이라지만
그러고 보면 인간처럼 허약한 것도.
자연은 자연의 품속에 가슴을 묻고
햇볕 한줌 물 한 방울
결국은 그들의 법칙대로 사는 것인
-박종국 홍성署 납세지원과장